[나무신문 서범석 기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목재 수종감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박병수를 첫 손가락에 꼽는다. 이 분야에서는 유일무이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수종감정을 위해 공무원 연금도 포기하고 매진하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코앞에 둔 그를 급하게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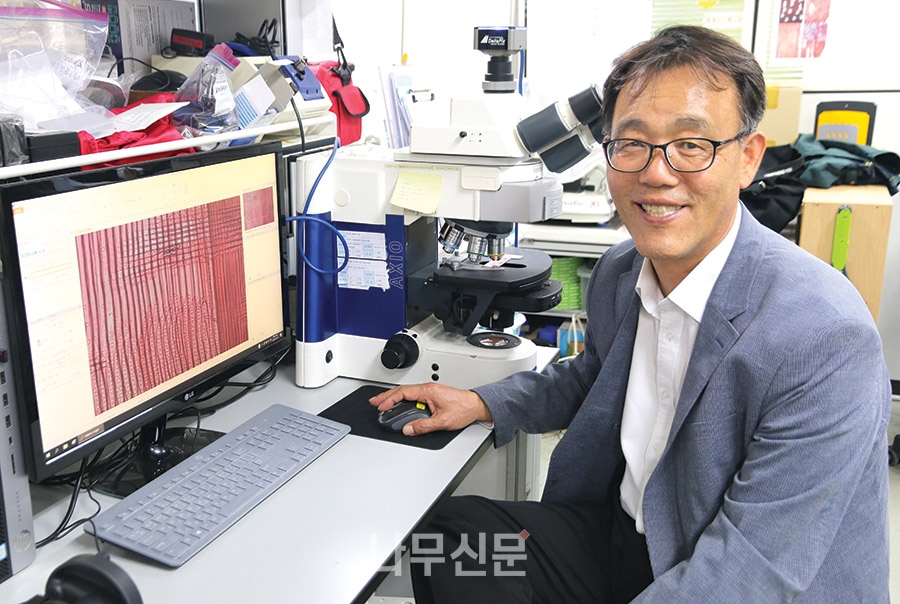
목재 수종감정이란 무엇인가.
목재 속에 그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나 배열 등 특성을 관찰해 분류하는 일이다. 쉽게 말해 이 나무가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를 특정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수목을 분류할 때는 나무의 꽃이나 잎, 수피 등의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지만, 제재된 상태에서는 수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수종감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재의 수종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적정한 용도와 쓰임새도 알 수 있다. 이미 정립돼 있는 데이터가 충분한 수종이라면 별도의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수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사용하려는 용도에 적합한지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주로 수종감정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관급공사에 목재를 납품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납품시 수종감정서를 첨부하도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납품 수종의 진위를 가려내는 게 주목적인가.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사 시방서에 잡혀 있는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속여서 납품한다면,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전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공사에 맞는 정확한 수종이 납품되도록 하는 게 수종감정의 1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재는 시장상황이나 자연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수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대체수종을 납품해야 하는데, 이 나무가 시방서에 잡혀 있는 목재를 대신해도 문제가 없다는 증명을 하는 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감정의뢰도 있다고 들었다.
주로 한약재의 진위여부를 가려달라는 의뢰가 많다. 예를 들어 1kg에 15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한다는 침향이나,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겨우살이 등에 대한 감정의뢰가 종종 들어온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겨우살이는 목본식물이기 때문에 가루를 내서 판매되는 것은, 그것이 어느 나무에서 자랐는지를 구분할 수는 없다.
일반인들의 목재에 대한 수종감정 의뢰는 없나.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해주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
수종감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료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우선 이것을 1㎝ 정육면체로 자른 다음 연화처리를 한다. 연화처리는 쉽게 말해서 물에 삶는 과정인데, 수종에 따라서 열흘 이상 걸리는 것도 있다. 연화처리된 시료를 다시 마이크로 톱을 이용해 1/100㎜ 두께의 횡단면, 접선단면, 방사단면 등 3단면 프라파레트(Prepalette, 현미표본)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 각 단면 표본의 세포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와 자료와 비교해 최종 시험성적서가 나간다.

정확도는 얼마나 되나.
현미경을 통한 목재식별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소나무류에는 100여 종이 넘는 수종이 있는데, 소나무와 잣나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소나무 중에서 러시아산 소나무와 유럽산 소나무는 현미경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목재의 성질이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다. 사용 용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미경 말고 다른 수단이 있나.
DNA를 이용한 구분법을 많이 구축해 놓은 상태다. 중요한 문화재나 편백이나 화백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DNA 수종감정이 가능하다.
구축된 표본이 풍부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70여 국에서 다양한 수종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은 현재 국립산림과학원과 공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5000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없다.
5000개의 표본이면 충분한 수준인가.
장기적으로 2만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독일 연구소는 1만8000개에서 2만3000여 종의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이 정도까지 확보해야 한다. 우리 기관과 외국 기관과의 MOU를 통한 데이터 확보도 고려할 사항이다.
언제부터 수종감정을 시작했나.
대학에서 목재조직학을 전공하고 90년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가면서 시작했다. 그러다 91년 말에 일본 유학을 떠났다가 97년 산림과학원에 복귀했다. 그 뒤 2012년에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넘어와서 수종감정을 계속하고 있다.
산림과학원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해서 퇴임 후에 연금도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지금은 후회하는데(웃음), 무엇보다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진흥원으로 왔다. 여기에 있으면서 오정애 박사와 박소연 연구사와 같은 든든한 후배들을 양성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 정년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목재와 임업분야의 컨설팅에 나설 생각이다. 내년이 정년이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에서 문화재 발굴현장에 나간 적이 있다. 현장에서 2000여 년 전 목재가 나왔는데, 그 나무토막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보존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담당 교수 말이 “앞으로 나보다 똑똑한 녀석이 나와서 멋지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문화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제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